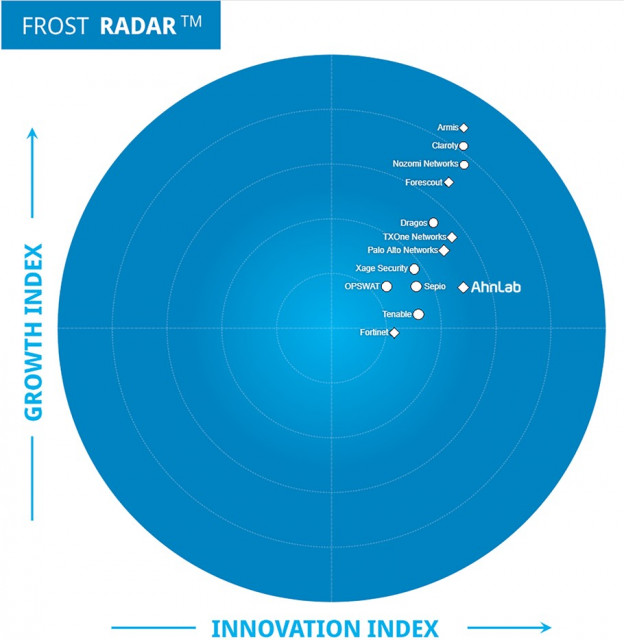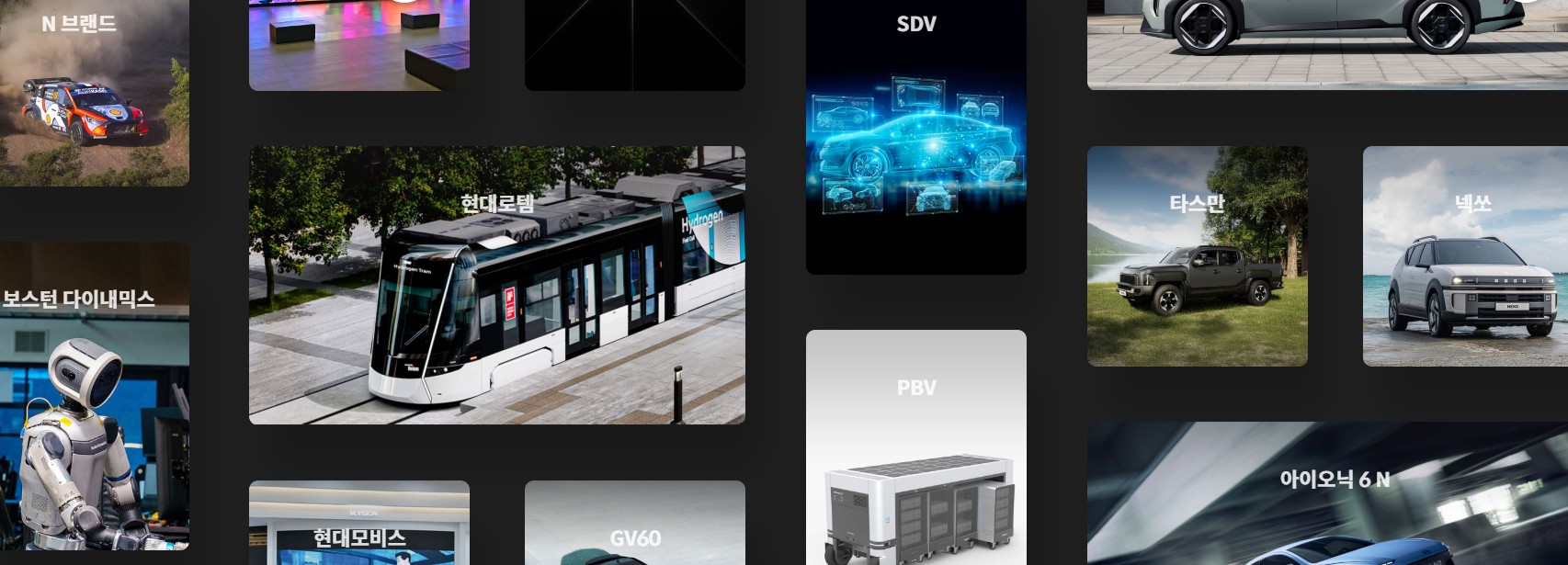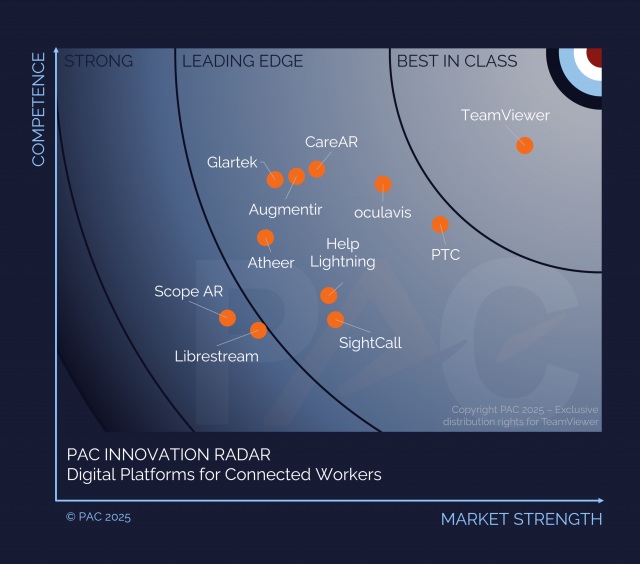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국 사태 수사’를 비난해온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은 윤 전 총장을 ‘윤짜장’이라는 멸칭(蔑稱)으로 부른다. 윤 전 총장이 잠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시절, 검찰청 복도를 걷다가 야근 중인 검찰 조사실에서 새어나온 짜장면 냄새를 맡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며 검사로 복귀한 일화를 비꼬아 공격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일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의 인간미(人間美)를 보여주는 ‘짜장면 일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창 시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짜장면을 돌린 선행(善行)의 기록이 최근 한 책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과 고등학교 동기인 전직 ‘연합뉴스’ 기자가 그를 3시간가량 만나 쓴 《윤석열의 진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는 중랑구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운동을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 그는 중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방과 후 축구를 자주 했다고 말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때의 기억을 내게 들려줬다.
그 중학교에는 어려운 형편의 친구들이 많았다고 했다. 1970년대이니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는가. 다반사로 한두 끼 밥을 굶는 이들도 적지 않았으리라.
어울려 자주 축구를 하던 친구들이 해가 어스름해질 무렵 집으로 가기 전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한참 동안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는 처음에는 목이 말라서 그런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한 친구로부터 “배가 고파서 수돗물을 들이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가정 형편이 비교적 넉넉했던 그는 주머니를 털어 친구들을 중국집으로 데려가 짜장면을 여러 번 사먹였다고 했다. 중학생 철부지였지만 배고파하는 친구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린 것이었다.
“너 대단하다.”〉
저자는 윤 전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야, 반갑다. 근데 너랑 나랑은 친구도 아니다”라며 “40년 만에 처음 보는 데 무슨 친구냐”고 대뜸 얘기했다고 한다. 동창이라고는 하지만 오랜 세월 만나지 못해 친구 사이라고 말하기가 겸연쩍어서 내뱉은 말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대답은 “따뜻했고 포용력이 있었다. 마음이 다 편해졌다”고 했다. 그가 “우리는 고교 동창이야. 한 번 고교 동창이면 영원한 동창이지”라고 화답(和答)했다는 것.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최근 자영업 전문가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고,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중소 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선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한국의 자영업 종사자가 1000만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취약해지면 중산층 형성이 어렵고 한국 사회의 안정과 성숙이 어려워진다”며 자영업을 살릴 방안을 물었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의 ‘경제 인식’을 보여준 대목이라 하겠다.
그의 언론관(言論觀)은 어떨까. 상기(上記)한 책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휴대전화가 자주 울리면서 이제는 일어설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교나 국방,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할 시간이 없었다. 자연스레 대화의 말미에 미디어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짧게 물었다.
그때 난 기자, 그는 취재원 같았다.
그랬더니 그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냥 자유롭게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