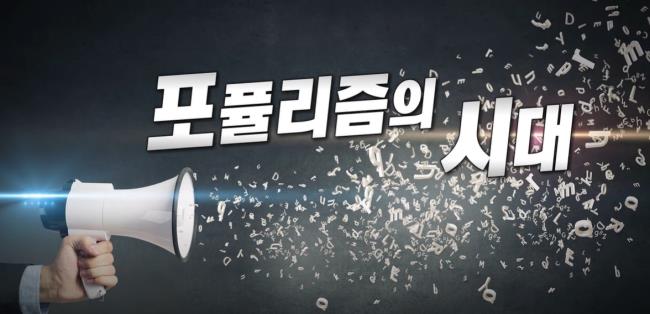
제20대 대선을 앞둔 올해 정치 현상과 사상에 관한 담론(談論)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고질병(痼疾病) 정치의 일환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연구한 논문이 재조명되고 있다. 작년 여름 포퓰리즘의 국내외 실태를 분석한 〈정치불신과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3호 수록)가 바로 그것이다.
논문은 “내각책임제 유럽 국가들에서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약진하는 이유는 의회 내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정부 구성에 참여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그동안 그들 사회 내에서 누적돼온 세계화, 이민,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재정적 위기를 가져오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난관에 빠지게 됐다. 정부와 기존 엘리트에 실망한 시민들은 이들에 저항하기 위해 기득권 정당에 반대하면서 포퓰리스트 성향 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중산층이 증가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산층이 정권의 업무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출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 활동이 감자기 활성화된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들 국가 내 포퓰리스트 정당의 확산은 개인주의적 가치에 정향화된 사람들이 기득권 정당, 노조나 교회 활동 등의 전통적인 활동을 벗어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치권 및 정부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최근 유럽 국가에서 유권자들이 특히 우파 성향 포퓰리스트 정당에 끌리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동시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세계화, 반이민 정서, EU(유럽연합) 통합에 반대하는 유럽회의주의 등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분노가 표출됐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이런 분위기는 2015~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EU의 이민할당제 시행 등의 ‘난민위기’라는 정점을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논문은 “네덜란드의 한 시의회처럼 시민대표들이 함께 모여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와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사례들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의 자정 능력이 없다면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캠페인이 포퓰리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한국은 유럽 선진국들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포퓰리즘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이념 및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심지어 젠더 갈등 등 사회적 분열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정치권 역시 정당 간 그리고 심지어 정당 내에서도 계파와 이념 차이를 중심으로 분열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스트 정당의 등장보다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터넷 발전으로 SNS는 물론 유튜브 활동 등 정당들은 물론, 정치인 개인들이 각기 자신을 위한 1인 방송을 통해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논문은 “유권자들 역시 자신의 이해와 선호 성향에 따라 누구의 것을 볼 것인지를 선택하지만, 공급자들의 과열된 경쟁 구조 속에서 콘텐츠는 과장과 거짓이 포함되기도 한다”며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인터넷에서 대중들과의 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물론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해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 및 정부 신뢰 역시 선진국 못지않게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포퓰리즘의 확산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