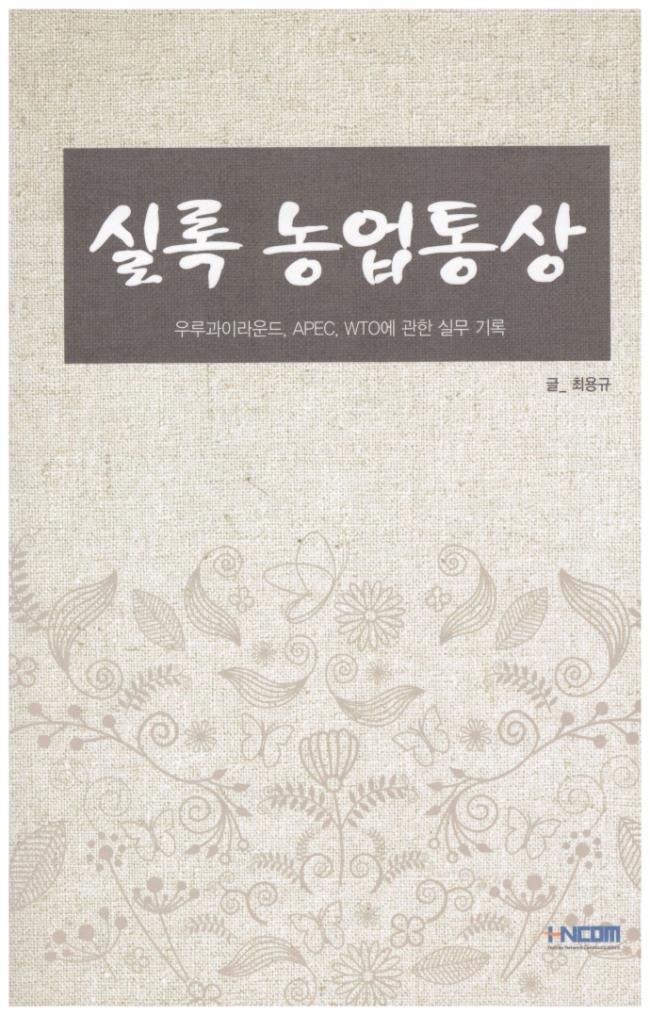
지금 우리의 식탁에는 외국산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 야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산 쌀은 우리의 식탁위에서 볼 수가 없다. 왜 일까?
우리는 지금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대부분의 수입 농산물은 관세가 낮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져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쌀만은 관세가 500%가 넘어 수입가격의 5배에 달하는 관세를 붙이게 되어 국내산 쌀 보다 엄청 비싸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업자들은 이를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쌀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붙이게 되는 데에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래 근30년 가깝게 끌어온 끈질긴 수출국들과의 대외 협상 결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면 쌀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전선에서의 무기와 후방에서의 식량이다. 식량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잊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휴전중이다. 특히 우리에게는 주식인 쌀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평상시에는 언제든 어디든 쉽게 구할 수 있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6.25 전쟁을 겪은 필자와 같은 연대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쌀 소비량이 연간 1인당 57㎏(‘20) 밖에 안 되지만 1970년 중반까지는 1인당 소비량이 130㎏을 웃돌 뿐 아니라 총생산량마저 부족하여 ’60, ‘70년대에는 혼분식을 장려하고 심지어 도시락 검사까지 하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에는 심각한 냉해를 입어 쌀의 생산량이 급감하여 근 200만 톤의 쌀을 긴급히 해외로부터 수입하기도 하였다. 미국에게는 50만 톤을 사주고 ‘82, ’83년 80만 톤을 더 구매해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는 결국 83년 이후 과잉재고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다행히 부족한 쌀은 과잉생산으로 재고가 많은 일본으로부터 100만 톤을 사올 수가 있어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다.
특히 우리가 먹는 쌀은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서 선호하는 장립종(long grain)과 달리 한국, 일본 그리고 일부 중국에서만 먹는 단립종(short grain)으로 세계적인 생산량이 많지 않아 얇은 시장(thin market)을 형성하고 있어 국제적인 양과 가격이 풍흉에 따라 상당히 불안하다. 우리의 쌀이 중요한 단적인 또 하나의 예가 UR이 한창이던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쌀 수입개방에 직을 걸겠다고 약속하였던 일이다. 그러나 UR 최종협상결과에서 장기간(10년간) 수입유예를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얻었어도 일부 수입(10년간 1%∼4%의 소비량만 수입)하게 됨에 따라 93년 12월 6일 대국민 사과발표까지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쌀 수입개방을 처음 결정한 것은 7년 3개월에 걸친 우루과이라운드협상(‘93.12.15)에서 이다 우리는 UR협상의 처음부터 일본과 공동으로 미국 등 쌀 수출국들과 개방 반대를 위하여 치열하게 끝까지 싸웠다.
그러면 함께 싸운 일본은 왜 그렇게 쌀의 식량안보에 단호하였을 까? 필자가 일본 주재 대사관 농무관(‘82. 2∼’86. 4)으로 근무하면서 겪은 경험을 소개하겠다.
1983년 초 도쿄의 아카사카에 있는 산노(山王)호텔 회의실에서 매월 1회 회동하는 도쿄 주재 외국대사관 농무관 모임(산노그룹이라고 했다)에 초청된 농림성 식량청 관료의 식량관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 외국 외교관이 그에게 “일본은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쌀 생산에 집중하고 보호하려고 하는가? 국제적으로 쌀이 남아도는 데 부족하면 값싼 쌀을 수입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당신은 호박(pumpkin) 하나만으로 6개월간 먹고 살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전쟁 중에 호박 한 가지만으로 6개월 동안 먹고 살았다.”고 정색을 하며 반문하였다.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물론 전쟁을 겪은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쌀의 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투철한 식량안보 인식이 우리와 함께 UR에서 쌀에 대한 예외조항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