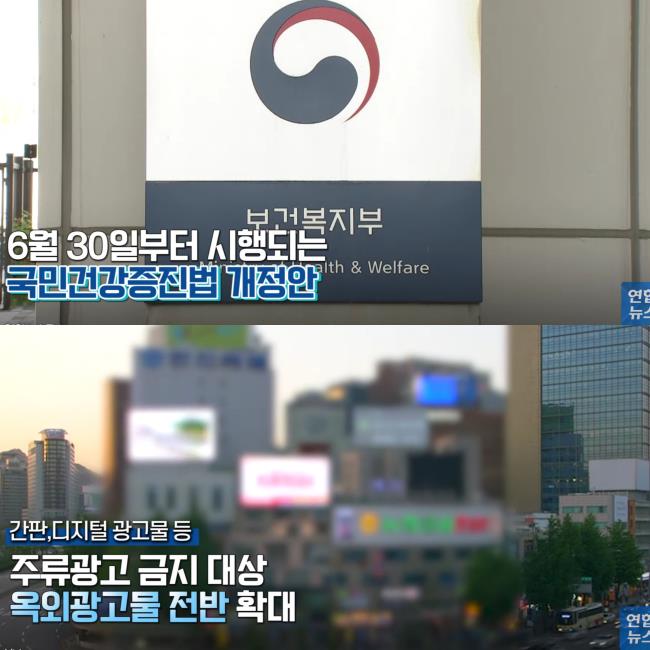
보건복지부가 ‘주류(酒類) 광고 금지’를 강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송 매체와 옥외 광고물의 주류 광고를 제약하고, 주류 업체가 특정 행사를 후원할 때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게 했다. ‘음주 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 환경 조성’이 명분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내린 취지만큼은 수긍할 만하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과도한 주류 선전이나 흥청대는 권주(勸酒) 문화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단속과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규제에 앞서 공익광고나 관련 행사 등 캠페인으로 음주 문화를 바꿔나갈 수도 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다. 집합·영업시간 제한으로 주점과 음식점 등 요식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 매출이 저조한데 바깥에 내놓은 술 광고물까지 치우라는 셈이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마시는 ‘혼술’족이 늘었다던데, 초저녁 술손님 발길까지 돌리게 하겠다는 건가. 문은 열었지만 파리만 날리는 식당에서 벽보 뜯고 입간판 거둬들이는 자영업자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관련 시장에 미칠 ‘연쇄 충격’을 고려했는지도 의문이다. 주류 회사는 물론 방송사, 홍보대행사, 광고물 제작 업체 등 ‘주류 광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사전조사는 했을까.
무엇보다 민간 광고를 제한해 개인의 소비를 통제하겠다는 당국의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개인의 취사선택을 방해하고 시장경제 논리에 역행하는 조치는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번에는 흡연 인구 줄이겠다고 담뱃값에 세금 매겨서 8000원선으로 폭등(暴騰)시키려 하지 않았나. 담배 한 대라도 없으면 사는 게 괴로운 서민들 주머니만 털어가는 ‘등골 브레이커’ 행태다.
술은 담배와 마찬가지로 기호식품(嗜好食品)이다. 취할지 말지는 성인 개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성분상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니 공공에서는 부작용만 경고해주면 된다. 정부 당국이 사적 소비의 영역에까지 개입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일러주고 거창한 도덕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절제할 것인지, 과용할 것인지, 아예 입도 안 댈 것인지는 개인이 결정해서 책임질 일이다.
사람들이 술 먹는 이유는 다양하다. 거의 모든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순간에 술을 곁들이는 게 우리 사회다. 특히 유독 힘들 때 우리는 술을 가까이한다. 요즘처럼 취업난이 극심하고 월급봉투가 얇아지며 가게 장사는 접을 판일 때 사람들은 술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술을 권하는 건 광고가 아닌 ‘경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복지부는 ‘폭음(暴飮) 사회’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 ‘술 권하는 사회’를 만든 건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쓴 광고물이 아니라, 민간의 성장을 단절시키는 ‘규제 천국’을 이룩한 현 정권이다. 세금 털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소득을 늘리고, 나랏빚 내는 추경과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을 이끈다는 꿈같은 소리만 하다가 금 같은 4년 세월이 다 저물어갔다. 경제는 말라터진 저수지 바닥에서 코로나라는 늪지대가 됐다. 헤어 나올 수 없는 ‘폭망 경제’에 청년들은 소주병을 기울이고, 어른들은 막걸리 잔을 든다. 절망이 안주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