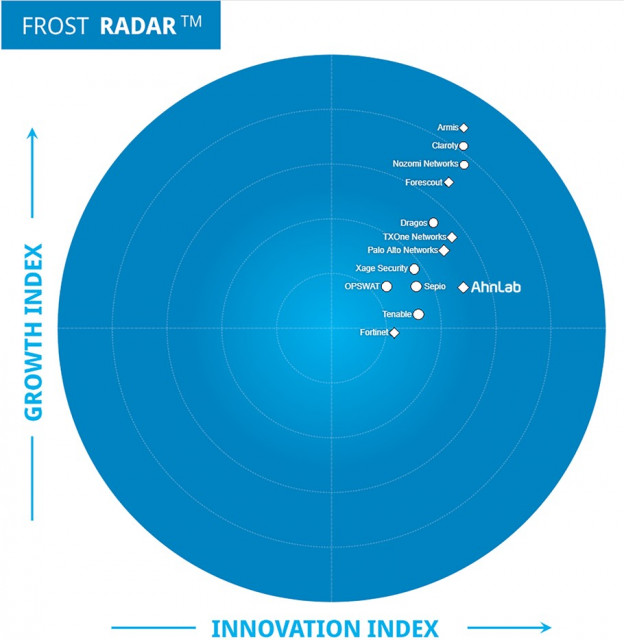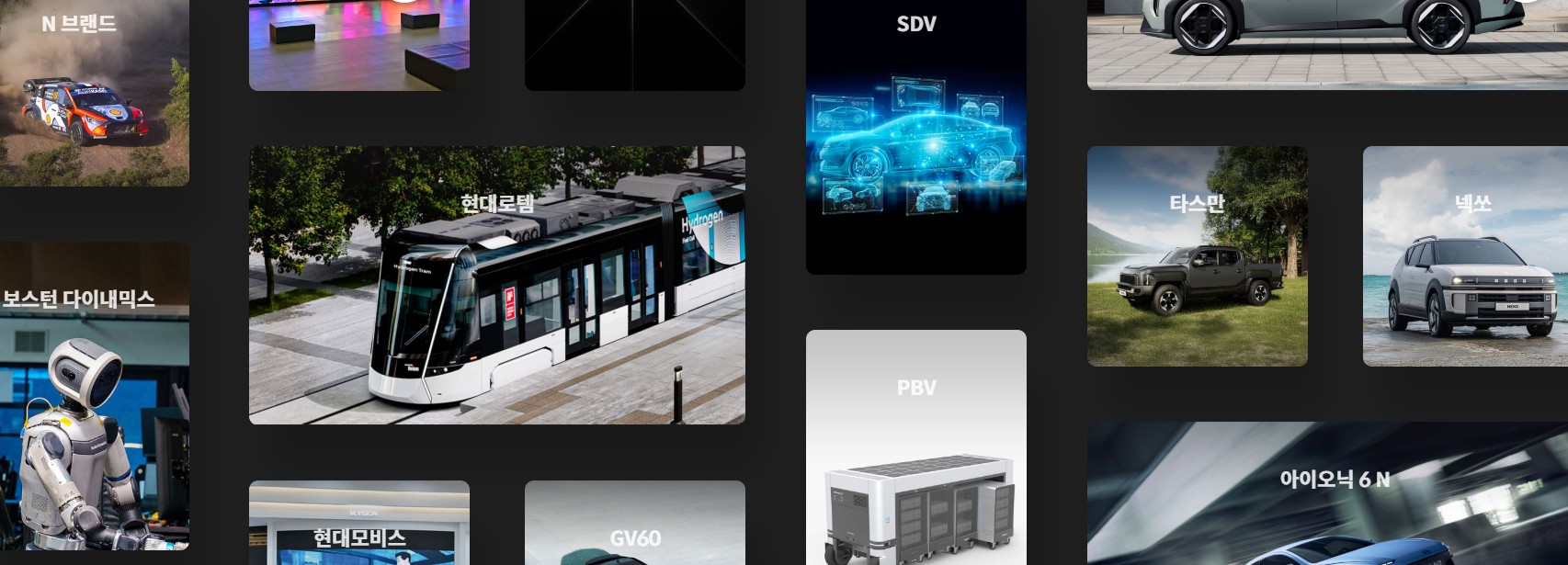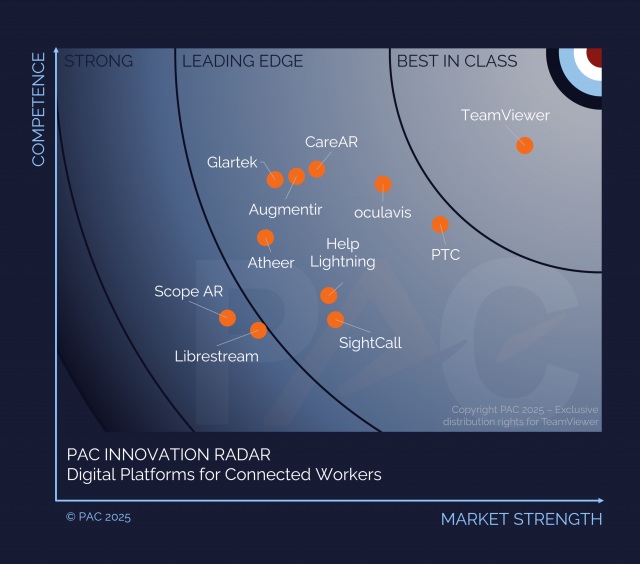야권(野圈)의 유력 대선주자(大選走者)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파격적인 잠행(潛行)이 연일 세간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초 퇴임 이후 일반 시민부터 교수·건축가·자영업자·인플루언서에 기성 정치인들까지 각계각층(各界各層) 인사들과 연쇄 접촉하고 있다. ‘반(半)공개 행보’ ‘광폭 행보’라 칭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학습하는 분야도 경제·노동·복지·외교안보를 시작으로 반도체·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국가 사회 분야 전반에 이른다.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공부하는 소위 ‘대통령 수업’이라 할 만하다.
윤 전 총장은 차기 대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 하반기 직전쯤 국민의힘에 입당(入黨)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전 총장 측근 진영에서는 ‘독자출마’론을 언론에 흘렸었다. 과거 정주영·김종필·안철수·반기문 등을 잇는 중도보수 성향의 ‘제3지대’ 개척주자가 되겠다는 심산이었다. 강력한 한국의 양당(兩黨) 체제 하에서 이전의 제3지대 출마 후보들은 실패를 거듭했으나,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이라면 승산(勝算)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 정권이 내세웠지만 도리어 지적받고 있는 ‘공정’ ‘법치’ ‘정의’ 가치의 회복을 천명(闡明)하는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새로운 미래담론을 만들어내며 어부지리(漁父之利)를 꾀할 수도 있다고 봤을 것이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은 결국 ‘기성 정당 입당’이라는 예상 가능하면서도 꽤나 험난한 노선을 택했다. ‘기성 정치권 입문(入門)’은 일견 잘 만들어진 울타리로 들어가는 ‘안정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느나, 실제로는 ‘제3지대 독자 출마’만큼이나 쉽지 않은 행로(行路)이다. 특히 강점만큼이나 약점 역시 상당한 윤 전 총장으로서는 예상외로 고단한 길이 될 수 있다. 현 정권에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출세한 이력 때문에 야권 입성 시 보수 색채가 강한 기존 경쟁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 정치 이력이 전무(全無)하고 당내 뿌리 깊은 세력이 부족하다는 점. 본인의 독자 출마를 기대하며 기성 정치권에 혐오감을 가졌던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 같은 위험에도 윤 전 총장은 입당의 길을 택했다. 이는 그의 ‘권력의지’가 그만큼 강고(强固)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보이는 위험과 구구한 난관이 있더라도 끝내 야권의 배에 올라 돛폭을 펼치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폭발적인 에너지의 표출’이다. 그것이 제 손으로 키운 총장을 식물로 전락시키고 민심을 배반한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을 터다. 또한 어차피 독자 출마를 하더라도 ‘배신자 프레임’ 등 민주당의 공격과 비난은 감수해야 하고, 후보 단일화 등 국민의힘과의 협상 내지 경쟁은 필연이었을 것이다. 스텝이 꼬이면 여야(與野)의 협공을 불러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고 봤을 것이다. 그럴 바에야 현재로선 무주공산(無主空山)이자 양팔 벌려 환영하는 국민의힘을 과감히 제패(制霸), 대권이라는 바다를 헤쳐나가는 튼튼한 용선(龍船)으로 삼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관건은 ‘정치 신인’인 그가 바람만으로 노회한 당내 세력을 끌어올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이야 꽃가마를 태우는 분위기지만 새 지도부와 당 실력자들은 경선 흥행을 위해 다른 주자들을 부추겨 윤 전 총장을 자극하고 맹공시킬 수 있다. 지금도 당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은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고, 최재형·김동연 등 현 정권 출신 인사지만 반문(反文) 성향에 가까운 다른 잠재 후보들까지 탐을 내고 있지 않나. 더욱이 여론은 무풍지대(無風地帶)를 압도하는 ‘진격의 거인’보다 골리앗을 꺾는 ‘다윗의 용맹’에 흥분하는 법이다. 윤석열 신화가 다 타버린 불쏘시개로 끝날 것인지, 정권을 집어삼키는 들불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