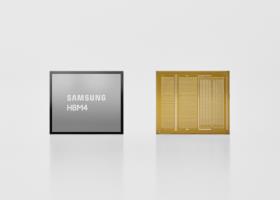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인정전(仁政殿)엔 조선 마지막 왕조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인지 밝은 낮보단 어두운 밤, 달빛에 비친 모습이 더 애틋하게 와닿는다.
창덕궁은 1405년(태종 5년) 경복궁의 동쪽에 이궁(離宮)으로 지어졌다. 이궁은 나라에 전쟁이나 큰일이 일어나 공식 궁궐을 쓸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지은 궁이다. 임진왜란(1592~1598)으로 조선의 모든 궁궐이 불타고 나서 광해군 때 가장 먼저 재건(再建)됐다. 이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하기 전까지, 창덕궁은 약 300년간 조선 후기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조선 궁궐 중 가장 오랜 기간 임금들이 거처해 '임금이 사랑한 궁궐'로도 불린다. 순종과 덕혜옹주 등 조선의 마지막 왕손들이 머물렀다. 왕실의 근엄함이 있는 경복궁과 달리, 주변과 잘 어우러져 정겨운 분위기를 풍긴다. 이처럼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가 탁월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199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창덕궁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법전)이다. 인정(仁政)이란 이름엔 '어진 정치'를 펼치겠다는 뜻이 담겼다. 정전은 궁궐의 중심 건물로, 신하들과 함께하는 조례나 외국 사신 접견, 왕 즉위식 등 중요한 국가적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인정전 내부엔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봉황 조각이 곳곳에 있다.

인정전은 구한말 근대 문화의 영향도 받았다. 순종이 대한제국 황제에 취임한 1907년, 인정전 내부가 서양식으로 꾸며졌다. 바닥엔 당시 유행하던 헤링본 양식의 서양식 마루가 깔렸고, 전등과 유리문, 커튼 등이 설치됐다. 일제 치하에서 인정전 조정(정전 앞뜰)엔 조선의 전통이던 박석을 덜어내고 일본인이 좋아하던 잔디가 깔렸다. 때론 왕의 뜻에 따라, 때론 외압에 따라 모습을 바꿔온 인정전엔 처연한 300년 역사가 새겨져 있다.
참고=《하브루타 국보여행》(최태규 글, 글로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