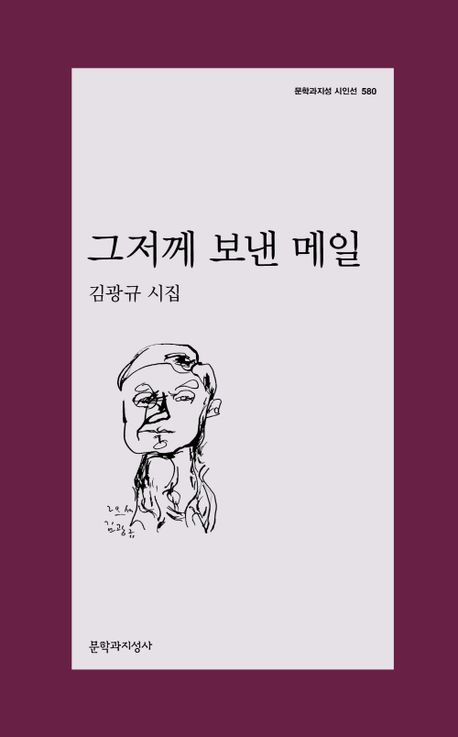
‘드넓은 산하 무수한 잡초들도
‘드넓은 산하 무수한 잡초들도
저마다 이름이 있기 마련
의미 없는 존재가 어디 있겠나
온 세상 모든 사물에 스며들어
혼자서 귀 기울이고 중얼거리며
그 속에 숨은 뜻 가까스로 불러내는
그런 친구가 곧 시인 아닌가’ -『그 짧은 글』에서
여든을 넘긴 김광규 시인이 열두 번째 시집 ‘그저께 보낸 메일’을 냈다. 직전의 시선집 ‘안개의 나라’ 이후 5년 만이다. 시인은 2016년 봄부터 2022년 겨울까지 일곱 해 동안 발표한 60편의 시를 묶었다. 문학과지성사는 시집에 대해 ‘인간의 생로병사를 품은 자연의 온기를 전하고 투명한 깨달음으로 독자를 인도한다’고 했다.
해설을 맡은 장경렬의 평이다.
“변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우리네 인간의 삶에 여일하게 위안과 안식을 주는 것들과 함께하며 자족의 삶을 사는 시인과도 만날 수 있다.”
출판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작가의 시는 흘러가는 삶 그 자체로서 움직인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들이 고이고 맺힌 자리를 절묘하게 포착한 시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덧댈 때, 시간이 정지한 듯 고요가 입을 벌린다. 소리 없이 진동하는 행간에 몸을 기대었다가 태연히 흐르는 시와 다시금 마주할 때, 우리는 생의 다음 국면을 엿본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의 시에는 40여 년 전 데뷔작에서 선보인 ‘있음과 없음’의 세계(「有無」 연작,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 문학과지성사, 1979)가 흐른다. 머물다 간 개별 존재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아닌데 광막한 울림을 주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일까.
김광규의 시 세계는 필연적으로 생몰을 거치는 존재의 애사(哀史)에 바치는 다정한 기록이다. 주위의 시선에는 아랑곳없이 미물의 양태에 진지하게 몰두하며 진실로 감탄하고 격 없이 소통하는 태도는 고스란히 시적 어조에 묻어나 때로 그윽한 유머를 낳는다.
김광규의 시는 수백 번의 조탁을 거친 단순한 어휘로 깨달음을 전한다. 단순성 너머엔 세계와의 화해를 향한 의지와 소통을 이끄는 매혹이 자리 잡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이 지배한 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꼬집는 정치한 견해마저 부드러운 노랫말 같으며(「로봇 한 마리」), 뇌 속 내분비기관의 노후로 인한 불면의 고통마저 신비로운 전설처럼 그려진다(「송과선 여사댁」). 그의 시편들은 어느 한 방향에서 대상을 바라보거나 명명하지 않고, 대상의 기원과 내력에 대한 수많은 추측을 포괄하며 조심스레 작성된 조감도(鳥瞰圖)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시인은 이번 시집을 두고 “내 마지막 시집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팔십이 넘으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 주변에서 많이 (세상을) 떠난다”며 “생로병사라는 세속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풀어냈다”고 이번 시집에 대해 평했다.
김광규은 누구?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및 동대학원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에서 수학했다. 1975년 계간 ‘문학과지성’을 통해 등단한 이후 1979년 첫 시집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으로 녹원문학상을 받았다. 1983년 두 번째 시집 ‘아니다 그렇지 않다’로 김수영문학상을, 1990년 다섯 번째 시집 ‘아니리’로 편운문학상을, 2003년 여덟 번째 시집 ‘처음 만나던 때’로 대산문학상을, 2007년 아홉 번째 시집 ‘시간의 부드러운 손’으로 이산문학상을, 2011년 열 번째 시집 ‘하루 또 하루’로 시와시학 작품상을, 2016년 열두 번째 시집 ‘오른손이 아픈 날’에 수록된 「그 손」으로 정지용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양대 명예교수(독문학)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