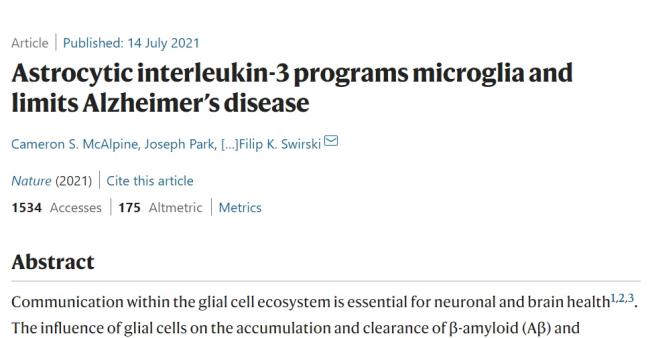
미국 하버드 의대와 수련병원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털(MGH) 연구진이 치매 유발을 억제하는 세포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지난 14일 《네이처(Nature)》지(誌)에 논문으로 실렸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뉴런(신경세포)의 사멸(死滅)과 함께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병이다. 뉴런은 뇌 신경조직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탱글’이 늘어나 ‘소교세포와 성상교세포’에서 염증이 일어날 때 죽기 시작한다. 여기서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응집한 것, 타우 탱글은 ‘타우 단백질’이 뒤엉킨 것을 말한다. 이런 각 단백질의 변형이 소교세포와 성상교세포를 활성화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으로 인해 뉴런이 집단 사멸하면서 치매가 발병한다.
루돌프 탄지 박사가 이끄는 MGH 연구팀은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탱글 같은 변형된 단백질들이 많이 생겨도, ‘소교세포가 관여하는 염증의 진행’을 막으면 치매 발병이 억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성상교세포’의 일부 하위 그룹이 ‘인터류킨-3’라는 성분을 분비, 소교세포가 염증을 일으키는 걸 막으면 된다는 내용이다.
연구팀은 성상교세포 그룹이 인터류킨-3를 통해 ‘염증 일으켜서 뉴런 파괴하지 말고,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탱글을 청소하라’고 소교세포에 지시하는 메커니즘에 주목했다. ‘성상교세포→인터류킨-3→소교세포’로 이어지는 지시 구조를 정상화시키면 치매 중증도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탄지 박사는 “신경 염증이 계속되면 죽는 뉴런이, 단지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탱글에 의해 유발되는 것의 최소 10배가 된다. 사실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 치매 증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뇌에 플라크와 탱글이 늘어났는데도 사망할 때까지 치매를 겪지 않은 환자의 사례를 확인하기도 했다. 플라크와 탱글은 많았지만 염증은 경미한 환자였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