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발전과 지역 인재 채용 및 경기 활성화 등 목적으로 주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예상 효과가 명확한 정책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1일 발간한 〈KDI 정책포럼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허실(虛實)을 점검한다.
KDI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주된 목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의 절약 및 미발전 지역의 성장을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2005년에 이전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9년에 마지막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마무리된 바, 정책에 대한 단기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KDI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혁신 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어나며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반 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를 나타낸다”며 “혁신 도시의 고용은 제조업과 지역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 기반 산업의 고용은 유의하게 늘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KDI는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별 고용 증대 효과를 살펴보면, 모든 산업의 고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식 기반 산업의 고용은 부산, 강원, 전북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이와 같은 지역별 편차는 부산의 영화산업이나 강원도의 의료산업과 같이 ‘이전 기관의 산업’이 ‘이전 지역의 기존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크게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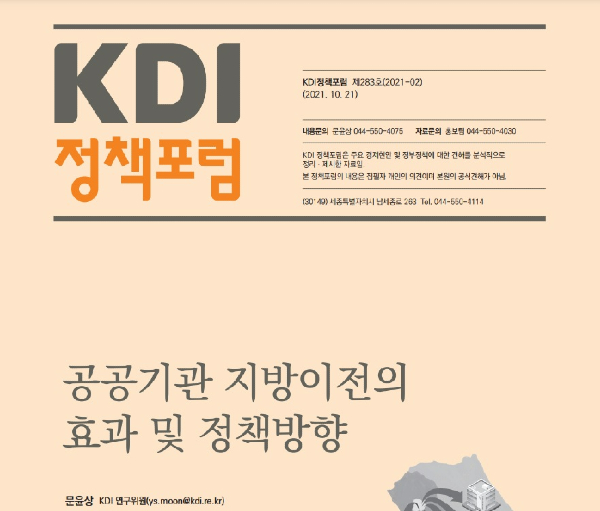
KDI는 “혁신도시의 정주(定住) 여건 향상을 위한 주택과 학교 등의 보급 노력은 혁신 도시의 인구를 단기간에 늘리고 제조업과 지역 서비스업의 고용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인다”며 “다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단기간의 인구 증가와 지역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은 지역 발전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며,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 주변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 도시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대도시의 기반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질적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식 기반 산업의 고용 효과를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 기반 산업의 조성이 중요하므로 지역의 특성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기관 일자리는 고학력·고숙련 일자리이므로 이들 일자리가 이전 지역 내 지식 기반 산업의 기초가 되거나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 기반 산업의 고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변 대도시의 기반 산업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의 공공기관을 해당 혁신 도시에 우선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