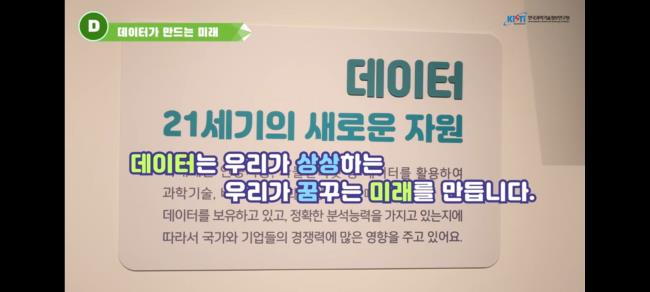
최근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중 데이터 패권 경쟁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데이터를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두 나라를 최대 교역국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경우 사안별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은 그 속성상 ‘기술 패권’, ‘경제 패권’, ‘안보 패권’의 다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핵심은 ‘데이터 패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정책과 중국의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정책이 글로벌 공조를 위한 동맹 규합의 선언이라는 의미를 띄고 있다면, 최근의 양상은 더욱 공세적이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 상원이 발의한 '2021 전략 경쟁법'은 대중국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이다. 중국도 데이터의 수집, 저장, 운반, 제공 전 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데이터안전법을 2021년 공표했다"며 "미·중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 양상은 보호와 활용이라는 상충되는 속성을 지닌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데이터 안보(Data Security) 차원으로 진화해 데이터를 매개로 한 신(新)냉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중국 모두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국가 안보와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를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위한 정부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과 국가 데이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데이터가 전 분야에 걸쳐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범부처 차원의 데이터 전담 조직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미·중 양국이 안보 논리와 데이터의 전략 자산화를 강조하면서 데이터의 로컬화 양상은 강화될 전망이며, 데이터와 관련된 생태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전반적인 탈동조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역외 이전 이슈의 경우 호혜평등 원칙에 기반해, 국가 간 데이터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상대국은 물론 자국 플랫폼에 대한 제재 등 데이터 기업에 대한 미·중 정부의 대응이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므로 한국의 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 내에서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내 기업의 공정 경쟁은 물론 한류 콘텐츠 경쟁력에 힘입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넷째, 미·중은 데이터 동맹 전략과 함께 AUKUS, SCO 등 아태 지역 내에서의 군사 동맹을 통해 대립 전선을 확대 중이나 교역과 연구협력 등에서 여전히 상호 의존이 높은 이중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므로 사안별 접근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