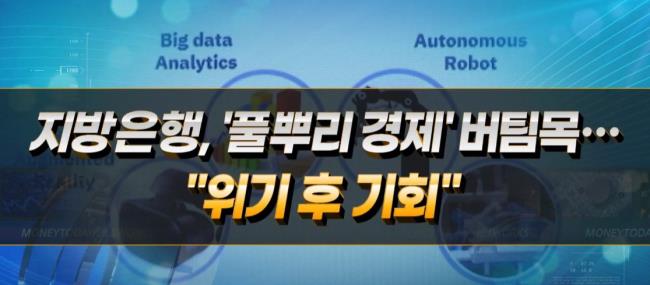
‘은행의 디지털화’ 핀테크가 금융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끄는 가운데 지방은행의 활로(活路)를 모색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은행의 경영환경과 향후 과제〉가 그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들어 지방은행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첨단지식기반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하고 있다”며 “둘째, 금융산업에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며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들이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핀테크·빅테크 등 새로운 경쟁자들이 은행 산업에 진출하며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은행은 지역민들과 지역 중소기업에 수준 높은 금융 서비스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정부 주도 경제 개발이 한창이던 1960년대 말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1도(道) 1행(行) 원칙에 따라 설립됐다. 1967년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부산, 충청, 광주, 제주, 경기, 전북, 강원 경남, 충북은행 등 10개의 지방은행이 차례로 신설됐다”며 “이후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10개 지방은행 체제가 유지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부실해진 일부 지방은행을 우량은행에 합병시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6개 은행만 존속하게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다. 2021년 6월 말 현재 가장 규모가 큰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의 총자산(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합)은 81.5조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500.0조 원)의 6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들은 전산시스템 투자, 금융상품 개발, 인재 영입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 우리나라 부의 대부분과 좋은 기업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이 주 영업구역이 아닌 어려움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지역 밀착 경영에 의한 관계형 금융,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지역민의 높은 충성도 등을 기반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에서 평균적으로 시중은행들보다 오히려 나은 성과를 보여 왔다”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매년 시중은행보다 높았다. 또 대출자산의 부실률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4년까지 매년 시중은행보다 더 낮아 건전성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방은행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를 위해 핀테크·빅테크와 제휴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용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두 개의 은행을 자회사로 가진 지방은행 지주회사는 IT 시스템 공동 사용 등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기존 점포를 거점점포와 주변점포로 그룹화하는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