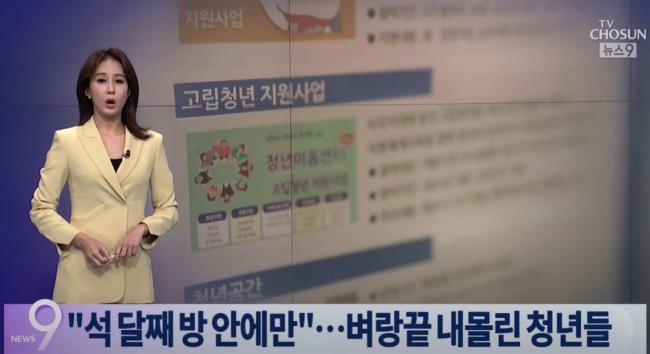
최근 발표된 서울연구원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의 순(純)자산 빈곤율(순자산이 3개월간 최저생활에 필요한 수준)이 중위소득 40%에 못 미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해 경제적 빈곤 위험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년의 순자산 빈곤율은 2010년 45.5%에서 2019년 57.6%로 약 12.1%P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불안정성 심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 소멸은 청년의 빈곤 위험을 높여 ‘록다운 세대(봉쇄 세대)’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성인 초기에 경험하는 결핍은 전 생애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의 빈곤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의 다차원 빈곤 영역으로 ‘경제, 교육·역량,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 복지’를 선정, 측정 지표를 통해 실태를 조사했다”며 “서울 청년은 경제, 교육·역량, 노동 영역 빈곤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 빈곤 감소율은 전체 감소율보다 낮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청년의 86.0%가 7개 영역 중 하나라도 결핍된 빈곤 위험 상태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3개 이상 영역이 결핍된 청년은 42.5%, 5개 이상 영역이 결핍된 심각한 수준의 빈곤 위험에 직면한 청년은 10.5%였다. 2020년 7월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청년 인구(311만4704명)를 적용하면, 약 32만7000명의 청년이 매우 높은 빈곤 위험에 직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서울 청년의 빈곤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은 경제, 교육·역량, 건강, 사회적 자본에 집중돼 있으며, 20대, 1인 가구, 저학력, 실업이나 비정규직, 비재학 미취업자, 저소득 청년의 취약성이 높았다”며 “성별은 건강과 사회적 자본 빈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는데, 남성은 사회적 자본 빈곤 위험이, 여성은 건강 빈곤율이 높았다. 20대는 경제, 주거 빈곤 위험이 컸고, 30대는 사회적 자본과 복지 빈곤율이 높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청년의 이행기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 청년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청년이 취약한 비경제적 영역 빈곤에 대한 집중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