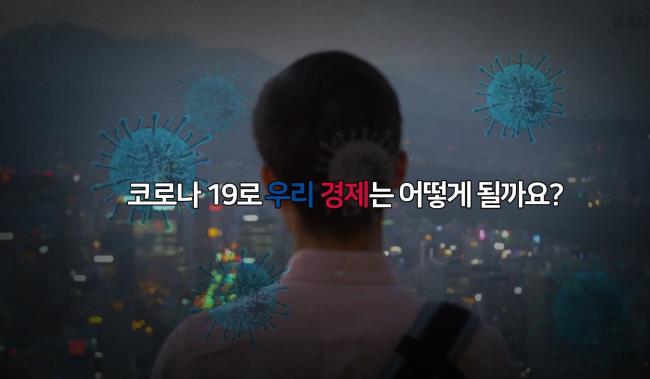
금년 부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지 만 2년이 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분석한 보고서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 위기 만 2년의 경제·산업 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확인됐던 지난 2020년 1월 20일로부터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간 시점에서, 경제 및 산업 구조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봤다"며 "우선 경제 구조 변화의 특징은 첫째, 교역 의존도가 코로나 위기 이전 2019년 75.9%에서 2021년 76.9%로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둘째, 소비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크게 하락한 반면, 순수출(수출-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후 크게 상승했다"며 "셋째, 민간 수요(민간소비+민간고정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78.2%에서 위기 이후 2021년 77.0%로 크게 하락한 반면, 정부 수요의 GDP 대비 비중은 2019년 1~3분기 21.8%에서 2021년 1~3분기에는 23.0%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음으로 산업 구조 변화의 특징은 첫째,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둘째,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컴퓨터, 전자 및 광학 기기 제조업+정보통신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1~3분기 10.9%에서 2021년 1~3분기에는 11.3%로 크게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셋째, 수출 통계를 이용해 제조업 세부 업종의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코로나 위기를 전후로 ICT 산업이 전체 수출 경기를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반면, 비(非)ICT 수출 중에서 특히, 기계와 자동차가 코로나 위기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넷째, 경제 전체로 보면 코로나 위기를 전후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변화가 없으나, 서비스업 내 세부 업종에 있어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문화·기타 산업 등은 크게 위축됐으나, 금융·부동산, 정보통신업 등은 오히려 시장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 및 산업 구조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인 수출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공급망 교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둘째, 직접적인 정부 소비 지출보다 민간 소비를 견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셋째, 코로나 위기에도 기업 투자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장 규제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며 "넷째, ICT 산업의 양적 성장이 경제·산업 구조의 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확산 가속을 통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